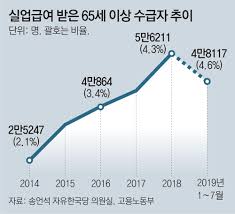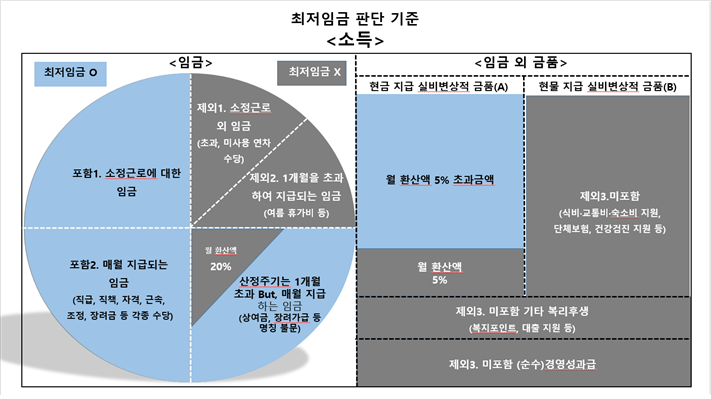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)에 따라 사업주는 "성희롱 예방 교육"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. 이 내용은 모두가 아실꺼라 믿습니다만....관련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직자, 중도입사자, 파견근로자 등은 교육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등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.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. 공사다망한 분들을 위해 일단 결론만 정리해보겠습니다. 1. 이전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더라도, 현재 회사에서 다시 받아야 함 2.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이후 입사한 직원에 대한 교육은 별도 필요 없음 3.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, 연차휴가, 파견, 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,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해야..